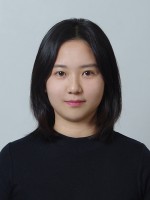최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원이 저성과자로 분류되면 센터장과 개별상담을 해야 하는 제도가 생겼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기관인 노동부에서 역으로 감정노동을 하는 상담원들의 압박감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었다.
취재를 마친 뒤 반론만 들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노동부에 전화했을 때 '책임운영기관'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됐다. 짐짓 당황하지 않은 척 노동부 소속 기관이니 노동부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되물으면서도 다급하게 책임운영기관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담당자를 연결해 준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고, 센터 홈페이지를 다시 보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라는 이름 앞에 '책임운영기관'이라는 명칭이 작게 붙어있었다.
책임운영기관은 조직·인사·예산 등의 기관운영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 책임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1999년 생겨났다. 당시 외환위기로 획일적 정부조직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도입됐다고 한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책임운영기관은 53곳에 달한다. 기관에 운영과 자율성을 준다는 말은 책임 역시도 온전히 옮겨간다는 의미기도 하다.
"활동을 보고받는 정도라 정확한 운영방식은 모른다", "예산도 노동부를 통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직접 받는다" 등 담당자와 몇 차례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센터 측의 연락처를 넘겨받고 전화를 끊었다. 이후 센터를 통해 정확한 상황과 반론을 들을 수 있었지만 찜찜함은 가시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 문제에 관해 얼마나 자유롭고, 기자인 나는 노동부에 얼마만큼의 책임을 물어야 했을까.
이는 단순히 '노동부의 얼굴'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던 상담원들의 자부심 서린 목소리 때문만은 아니었다. 위탁업체 소속 직원으로 출발한 상담원들이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직접고용으로 전환돼 공무직 신분이었던 데다,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 등도 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순환직이었기 때문이다. 어려운 줄다리기만 계속된다.
/목은수 사회부 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