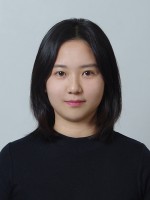재희씨가 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 없었던 건 체념 때문이었다고 한다. 쉼터에 오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자원봉사를 위해 쉼터를 방문했던 한 대학생에게 처음으로 도움을 구했으나, 역으로 원장에게 소식이 들어가 다시 맞았다고 했다. 이후로도 쉼터를 도망쳤다 붙잡혀오거나 스스로 돌아왔던 학생들을 향해 직접적인 폭력이 반복됐다. 그녀에게 쉼터는 항상 '돌아가야 하는 곳'으로 각인됐다.
그러나 틈이 생기자 재희씨의 몸은 본능적으로 튀어나갔다. 원가정에 갔다가 쉼터로 복귀했던 어느 명절날이었다. 재희씨는 집에 갔다가 저녁 늦게 쉼터로 돌아왔고, 집에 가기 위해 싸놓았던 짐이 옆에 놓여 있었다. 명절이라는 사실이 주는 평온함 때문인지 함께 머무르며 서로를 감시하기도 했던 언니들은 재희씨를 둔 채 위층으로 올라간 때였다. 직전까지도 이곳을 벗어날 생각이 없었던 재희씨는 작은 틈이 생긴 순간 쉼터의 문을 열고 '이십분동안 멈추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렸다.
그럼에도 재희씨의 경험이 학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공적으로 다퉈보기 어렵게 됐다.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날부터 7년이기 때문이다. 신문고에 글을 올리고,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본인의 경험을 정리해 올린 때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후였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붙잡혀 원장실로 끌려가는 꿈을 계속 꿔요." 쉼터에서 나온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 원장을 경찰에 고소하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릴 결심을 한 이유를 묻는 물음에 재희씨는 이렇게 답했다.
/목은수 사회부 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