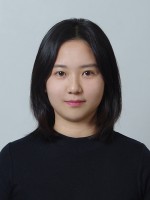지난해 '용인 유기사건' 피해 유족
원래 자리 파보니 유골 일부 방치
토지매수업체, 분묘발굴죄 재판중

지난해 분묘 20여개가 임의로 유기돼 논란이 된 '용인 분묘사건'의 피해자 A씨는 지난 4일 어머니의 유골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92번 푯말 아래를 파 내려갔다. 남들보다 분묘가 옮겨진 사실을 늦게 알게 된 만큼 하루빨리 어머니를 좋은 곳에 모시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파도 유골은 나오지 않았다. 모래 한 줌이 들어있는 비닐만 나타난 게 전부였다. 이를 두고 이장 작업 담당자는 "시간이 너무 지나 육탈된 것 같다"고 했다. 미리 예약한 화장시간이 임박한 탓에 A씨는 별 수 없이 비닐 속 모래를 화장한 뒤 납골당에 모셨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주말 내내 이상한 낌새가 가시지 않은 A씨는 지난 7일 본래 어머니가 묻혀있던 묫자리를 찾아갔다. 비석 하나 남아있지 않았던 곳의 땅을 파보자 관 속에 그대로 있는 어머니의 유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상태는 온전치 않았다. 관 뚜껑은 사라졌고 턱뼈는 뒤집혀 있었으며 두개골은 아예 사라졌다.
A씨는 "업체 측에 어머니 유골을 정말 옮긴 게 맞냐고 수차례 물었는데도 '하늘에 맹세코 창호지에 싸서 묻었다'고 했다"며 "한마디 말도 없이 분묘를 옮긴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어떻게 제대로 수거조차 안 할 수 있느냐"고 분개했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용인에서 발생한 분묘 유기사건(2023년 9월27일자 7면보도=용인서 공동묘지 분묘 유기·훼손… 2021년 매입 업체 용의자로 의심)의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 분묘가 무단으로 옮겨진 것도 모자라 이장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현재 이 분묘 무단 훼손·이전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지자체에 신고 없이 분묘가 개장된 사실을 확인한 용인시 처인구가 장사법 위반 혐의로 해당 토지 소유주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토지를 매수한 B업체 관계자가 피고인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분묘발굴죄 혐의까지 더해졌다. 무단으로 이전된 분묘는 총 22기(연고 10·무연고 12)로, 오는 22일 세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B업체 관계자는 이장 신고를 하지 못한 건 실수지만, 이장 작업 당시 전문업체에 맡겼다는 해명을 내놨다.
B업체 관계자는 "이장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지 몰랐고, 사전에 지자체 홈페이지에 작업 공고를 내고 제사도 지냈다"며 "최근 A씨 어머니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개골을 찾아 DNA 검사를 맡겼다. 당시 작업을 맡은 업체에서 수거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다"고 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