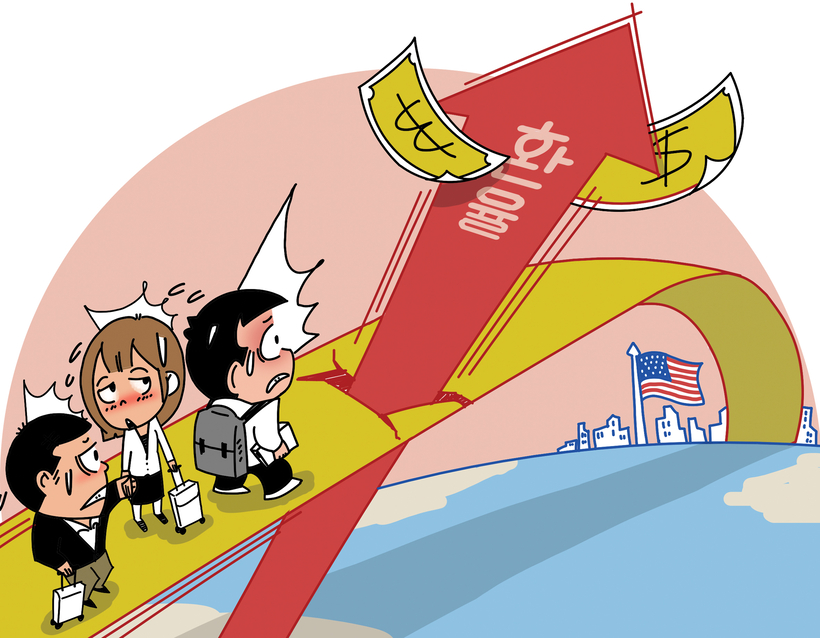지난달 24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맡아온 A교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른 살의 특수교사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켜 자신의 특수학급으로 옮겨 온 장애학생을 비롯해 모두 8명의 장애학생을 가르쳐왔다.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 학생 기준은 6명이지만 A교사의 특수학급은 올해 3월에 7명으로 늘었고, 8월에 1명이 더 늘어 법적 기준을 2명이나 초과한 상태였다. 특수교사들의 한 주 수업시수는 평균 20시수 안팎인데 A교사는 29시수나 됐다. 거기다 통합학급에 다니는 6명의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업무도 추가로 맡았다. 올해 4년 차로 경력이 많지 않은 A교사에겐 버겁다는 표현으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고뇌가 있었을 것이다.
A교사는 스스로 세상을 등지기 오래전부터 가족과 동료 교사들에게 고충을 토로해왔다. 공개된 고인의 메신저에는 그가 겪었던 일과 소회가 가득 담겨있다. 과밀학급 실태를 비롯해 특수학급 전일 분리수업, 과도한 행정업무, 중증 장애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지원 부족, 일부 학부모의 민원, 관리자와 교육지원청의 책임 부재 등을 호소했다. 특히 동료 교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선 "눈물이 난다", "더는 버티기 힘들다", "자원봉사자 지원으론 한계가 있다"며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인천시교육감이 교원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특수학급 교육환경 개선 간담회에서 숨진 A교사와 유가족에게 사과하면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말 그대로 '뒷북'이다.
문제의 핵심은 특수교육과 담당 교사에 대한 관리와 지원의 부재다. 법적 기준을 초과한 8명의 학생으로도 모자라 통합학급의 학생 6명까지 모두 14명이나 되는 장애학생을 임용 5년 미만의 교사 한 사람에게 떠맡겼으니 이게 어떻게 특수교육 현장이 관리되고 있다고, 특수교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6천183개 초등학교에서 5천582개의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고, 1만400여명의 특수교사가 3만여명의 장애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런 참담한 현실이 인천에만 국한된 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각성, 그리고 현실적인 대응과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겨우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