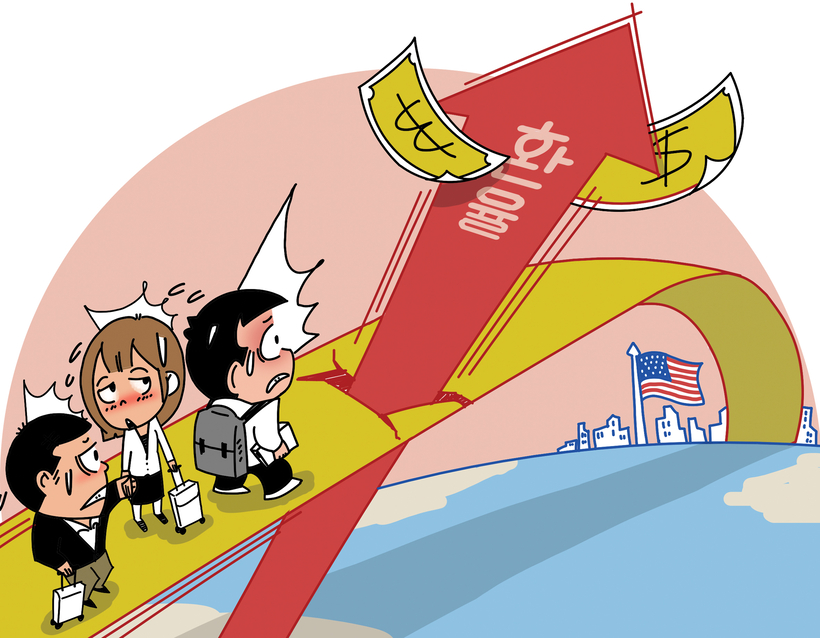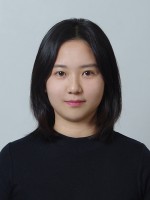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17년차 유튜브 영상 편집자 A씨는 영상 등 콘텐츠 제작자에게 수 차례 수정 요구를 받으면서도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정해진 계약금을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상황이 심각한 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보기도 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인 탓에)사업자라 방법 없으니 민사 소송을 제기하라’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다는 것이다.
영상 미디어 산업이 날로 성장하고 있지만 유튜브 등과 같은 영상 편집자들은 열외지역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완성된 영상 길이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구조 등 탓에 오랜 시간 일하면서도 그에 적합한 소득을 받지 못한다고 편집자들은 호소하고 있다.
7일 청년유니온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 등은 ‘유튜브 영상 편집자 노동 실태 심층인터뷰 결과 발표 토론회’를 열고 “방송미디어 산업이 커지면서 같은 콘텐츠 제작자 사이에도 방송사·제작사·개인 미디어 창작자라는 층위가 생겼다”며 “제작자 중 마지막 단계인 개인 미디어 창작자보다 열위에 놓인 게 영상 편집자. 업계 내 진입이 쉬운 만큼 노동법과 계약서가 적용되지 않는 무법지대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실제 센터가 지난해 유튜브 영상 편집자 28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노동시간에 비해 소득이 크게 낮았다. 편집자 10명 중 2명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했고, 절반 가량은 시간당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이들은 오랜 시간 일하면서도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분당 단가’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계약 당시 영상 1분에 해당하는 단가를 정한 뒤 편집이 완성된 영상의 길이(시간)에 따라 보수를 받는 방식인데, 원본 영상의 상태와 편집자 역량에 따라 작업 속도에 차이가 나타남에도 보수엔 반영되지 않는 구조인 것이다. 경기 지역 3년차 편집자 B씨는 “단가를 제각각 산정해 편집자 개인의 협상력에 따라 소득이 결정될 수밖에 없고 대체자가 많아 적정 금액 요구도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에 법무법인 시민 이종훈 변호사는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제작자가 영상 편집 방향이나 지침을 하달하는 등 명령을 내렸다면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따져봐야 한다”며 “미디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아닌 것처럼 계약 맺는 경우가 많아 계약 관계 입증 책임을 사용자(제작자)에게 지우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