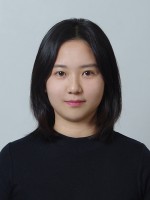환경 규제 또 번복 걸리자 경기 중소업체 불만

파주에서 빨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환경부 종합국정감사를 보고 처참했던 지난해 11월 공장 상황이 떠올랐다고 했다. 본래 플라스틱 빨대만 생산하던 김씨는 지난 2018년 환경부의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금지’ 정책 발표를 보고, 땅에 묻으면 분해 후 사라져 친환경으로 꼽히는 ‘생분해성’ 빨대 제품 개발에 뛰어들었다. 김씨는 반년만에 개발에 성공한 뒤 플라스틱 빨대 규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생산라인 9개 중 7개를 생분해성 빨대로 전환해 1천960만개의 물량을 쌓아뒀다.
그러나 정부가 플라스틱 규제를 ‘무기한 연장’으로 번복하면서 김씨의 발 빠른 대처는 모두 재고로 돌아왔다. 그는 “두 달 동안 공장 가동을 멈추고 세 달 동안 직원들을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재고 털기에만 집중했었다”며 “제품 개발과 설비투자가 필요한 제조 업체는 정부의 정책을 보고 확장성을 생각한 뒤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정책을 바꿔 모두 피해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환경 규제를 재차 번복하면서 경기지역에서 환경 물품을 생산해 온 중소업체들은 정부의 정책변화를 읽고 선도적으로 뛰어든 중소업체의 피해가 막중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최근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의무화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음료 가격에 용기 가격을 함께 매기고 반환할 때 돌려받도록 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환경 규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단속하기로 했던 카페의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금지 규제도 시행 직전 적용을 무기한 유예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환경부는 현장과 속도를 맞추기 위한 정책 방향의 ‘전환’이라고 설명하지만, 일선에선 사실상 환경 정책의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선도 지역이었던 제주도에서 보증금제 정책에 참여했던 매장은 지난해 10월 422곳에서 1년 사이 281곳으로 줄었다.
특히 제조업체들은 환경 분야는 미래에 더 유망해 작은 규모 업체가 뛰어든 경우가 많아 피해 역시 중소 업체에 집중됐다고 토로한다. 최근 경기도 광주에서 충북 음성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한 재사용컵(리유저블컵) 제조업체 대표 최모씨는 “지금 시점에 수익성이 낮은 환경 물품은 점유율이 높지 않아서 새롭게 뛰어든 중소 제조업체나 스타트업이 많았다”며 “기업들이 정부와 손 잡고 홍보 활동을 벌이는 등 인식변화를 만들며 함께 성장한 건데, 돌연 정책을 바꾸면서 작은 업체의 피해 역시 커졌다”고 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 규제는 지속하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안내, 계도 등 문화적인 방식으로 규제 방향을 바꾼 것”이라며 “올해 89억원이던 다회용기 지원 사업 예산을 내년도에 1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라서 다회용기를 제조, 세척하는 작은 규모의 업체는 혜택을 받는 곳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