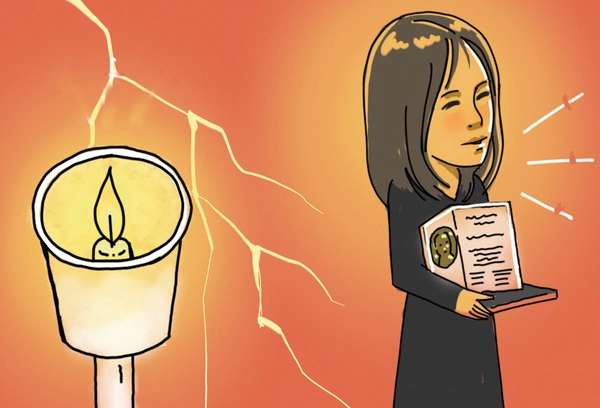
“언어를 다루고 있는 문학 작품은 필연적으로 일종의 체온을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문학 작품을 읽고 쓰는 행위는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다.” 2024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수상 소감이다. 작가 한강이 10일(이하 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세계 문단이 아시아 여성에게 베푼 최초의 문학 대관식은 시종일관 정중했다. 한강은 격조 있는 문학의 언어로 이를 수락했다.
한강은 7일 스웨덴 한림원에서 열린 수상자 강연에서 여덟 살 때 지은 시를 공개했다.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사랑이란 무얼까?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그는 “내 모든 질문들의 가장 깊은 겹은 언제나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쉰네 살 한강의 문학을 지탱해 준 궁극의 질문이 여덟 살 소녀 한강의 심장에서 비롯됐음을 고백했다.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는 각각 광주와 제주의 비극을 다룬 작품이다. 현재의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거나 망각한다. 기억하는 방식은 각자 다르다.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놓고 원인의 선후를 서사의 진위를 시비한다. 정치적 인간들이 벌이는 짓이다. 노벨상 수상 전후로 한강의 작품들에 비루한 시비가 따라붙은 이유다.
한강은 역사적 사실에서 기록과 숫자로 수장된 희생자들을 문학의 사유와 언어로 현재에 이어 놓았다. 작가는 그 까닭을 2014년 ‘소년이 온다’를 출간하고 난 뒤에야 문득 사유했고, 작년 오래된 구두상자에서 만난 어린 한강의 시에서 확연하게 깨달은 듯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쓴 책들을 뒤로하고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이라 했다. 한강의 문학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선언 같다.
공교롭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비상계엄이 덮쳤다. 광주와 제주의 양민학살의 배경에 비상계엄과 계엄군이 있었다. 한강은 ‘2024년 겨울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도 작가들에게 사유의 소재일 것이다. 계엄의 명분은 헌법을 유린했고 실행은 터무니없었다. 반면 계엄을 저지한 시민의식과 계엄군의 자제력은 뚜렷했다. 문학적 사유는 후자를 주목할 것이다. 비상계엄 저지로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제대로 본 것도 큰 다행이었다.
/윤인수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