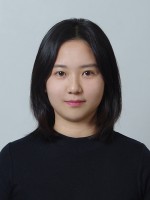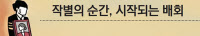장사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앞둬
장사시설 내·해안선 5㎞ 해양 한정
“의미있는 장소란 인식 간과” 지적
화장한 유골(골분)을 산과 바다 등지에 뿌리는 ‘산분장’의 활성화 내용을 담은 장사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7월12일자 3면 보도)을 앞두고 있지만, 세부 시행령에서 산분장이 가능한 구역을 지나치게 한정해 오히려 규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화장한 골분을 특정 장소에 뿌리는 장사 방법인 산분장이 합법화된다.
기존에 관련법이 없어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산분장을 제도 내에서 관리해 포화 상태인 봉안시설의 대안으로 산분장 이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산분이 가능한 구역을 ‘장사시설 내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과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해양’ 등 두 곳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산과 하천 등 구역 외에서 골분을 뿌리는 행위는 위법의 범주에 포함, 제약만 커진 셈이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지의 70~80%가 사유지인 상황과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등을 두고 민원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산분장은 산림·해양·도로·하천법 등 다양한 법과 엮여있어 부처 간 합의를 이끄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이어 “해양과 장사시설을 먼저 지정하고 향후 산분이 가능한 지역을 더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산분이 단순히 골분을 처리하는 행위가 아니라 의미있는 곳에 뿌리는 행위라는 인식이 간과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재실 전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유족들은 골분을 선산이나 고향의 뒷산처럼 고인에게 의미가 있거나 추억이 담긴 장소에 뿌리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사시설 내 유택동산이나 해양장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존 장사시설 설립 규제처럼 산분장이 불가능한 장소를 법에 지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박태호 장례와화장문화연구포럼 공동대표는 “장사법에는 장사시설을 일부 보호구역처럼 설립이 불가능한 곳을 지정해두고 있다. 이외의 곳은 다 가능하게 열어둔 것”이라며 “산분장 역시 시행령에서 금지 장소를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하고, 개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 상황에 맞게 정하면 된다”고 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