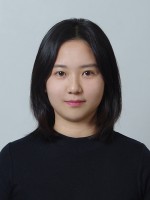부모 묫자리 개장하면서 일부 발견
업체 인근 시유지 이장 주장 배치
“무연고도 아니고 이럴수 있나”

유족에게 별도의 안내 없이 무단으로 분묘를 이장해 논란이 됐던 ‘용인 분묘유기사건’ 장소에서 유골이 온전히 이장되지 않은 또 다른 피해 사례가 발생, 해당 유족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2023년 추석을 앞두고 용인의 한 공동묘지에 있던 분묘 20여기가 인근 시유지로 옮겨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용인시는 ‘묘지가 사라졌다’는 일부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지자체 개장 신고 없이 분묘가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장사법위반 혐의로 특정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묘지가 있던 부지를 매수한 A업체 관계자를 피의자로 특정, 분묘발굴죄 혐의를 더해 검찰에 넘겼다.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은 A업체가 분묘를 옮긴 것도 모자라 이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A업체는 공동묘지 인근 시유지 내 기존 묫자리 번호가 적힌 푯말을 박아두고 그 아래에 이장했다고 줄곧 주장해 왔지만, 본래 묘지 위치에서 유골이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4년 아버지에 이어 2007년 어머니까지 합장했던 B(67)씨는 지난 14일 원래 묫자리를 개장하면서 부모의 유골을 발견했다고 했다. 매장 당시 시신과 함께 묻었던 덮개가 나오면서 부모의 유골임을 확인했는데, 이마저도 어머니의 유골은 극히 일부만 발견되는 등 온전치 않은 상태였다.
B씨는 “2023년 여름, 추석 이후 이장하려고 개장신고서까지 떼 놨는데, 그 사이에 분묘가 파헤쳐졌다”며 “나중에 업체로부터 묘지를 팠는데 흙만 있었다는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 파보니 유골이 나온 것이다. 무연고도 아니고, 아들이 둘이나 남아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분개했다.
앞서 또 다른 분묘 유기사건의 피해자인 C씨도 A업체가 이장했다고 주장한 위치에서 유골이 나오지 않아, 원래 묫자리를 파내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유골을 발견(2024년 10월18일자 5면 보도)한 바 있다. 이마저도 관 일부와 두개골 등은 없는 불완전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 A업체 관계자는 “직원들이 처음에 B씨 부모의 묘를 팠을 때는 유골이 없었다. 흙이 좋으면 시신의 부패가 빨라 흙만 남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안다”며 “(C씨 사건 이후) 기존 이장 작업 당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기존 묘지를 전부 다시 팠고, 그때 새로 발견된 유골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