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흘러도 ‘그날’에 갇혔다면 ‘날’ 돌 볼 차례
인명구조에 우선순위 밀려 ‘관리’ 등한시
긴장·불안·두근거림 증가 증상 중 일부분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음 앱’ 회복에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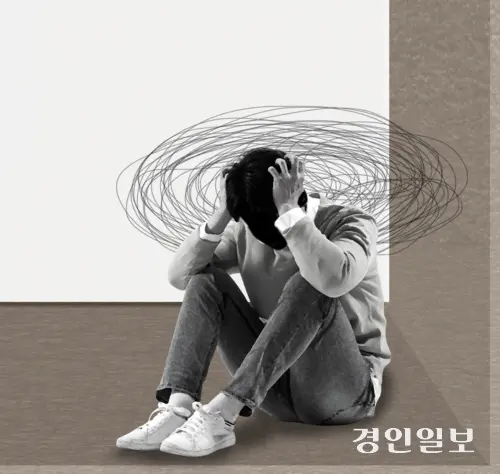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말하는 ‘트라우마’ 증상은 무엇이고 치료 적기는 언제일까.
트라우마는 정신적인 외상을 뜻한다. 이병철 한림대한강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트라우마를 의학적으로 진단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며 “월남전에 참전하거나 이를 가까이서 겪은 이들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일종의 후유증을 앓는 것이라는 결과가 나와 진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라우마 증상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보통은 트라우마를 겪은 때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면 몸이 긴장하거나 불안감이 높아진다. 크게 놀라거나 두근거림이 생기는 것도 증상 중 하나다.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우울감을 느끼고 수면 패턴이 변화하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트라우마를 겪는 상황을 피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문제인 일상 속 트라우마와 달리 재난에 의한 트라우마 치료가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재난은 예측 불가능한 때에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트라우마로 인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전문가를 찾는 편이 좋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그 기한을 한달이라고 본다. 김태원 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한달 정도 지나면 70~80%는 트라우마 증상이 서서히 없어지는데 그렇지 않다면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말했다. 이 교수도 “치료 시기를 놓치면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을 보탰다.
대형참사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건 관계인들은 트라우마를 겪더라도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김 교수는 “참사가 발생하면 목숨을 구하는 게 우선시되기 때문에 트라우마 등 정신건강학적인 접근이 후순위로 밀린다”며 “의료진의 인력적인 한계로 인해 대형참사를 겪은 당사자와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개개인별 맞춤 치료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 교수도 “한국은 재난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은 정신적으로 나약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며 “국가에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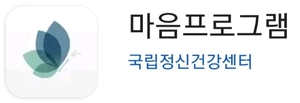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음프로그램 앱’을 아시나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운영하는 앱으로, 트라우마로부터 회복을 돕는 다양한 안정화 기법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