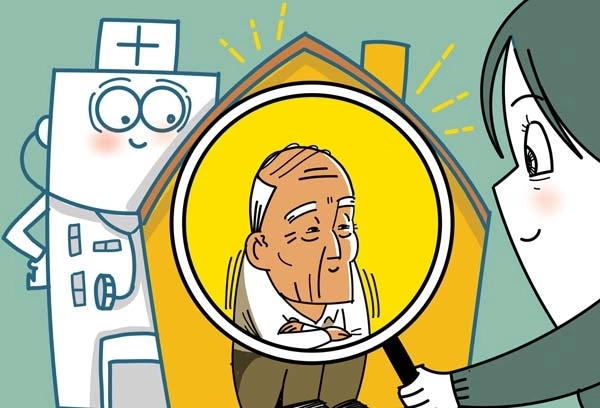
기네스 세계기록(GWR)이 공인한 인류의 최장수 생존기간은 122년164일이다. 프랑스 여성인 잔 루이즈 칼망으로, 1875년 태어나 1997년 세상을 떠났다. 1991년 칼망 할머니는 “열세살 소녀일 때 천재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구애를 받았다”고 일화를 소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세계 최고령’ 기록은 일본 여성 다나카 가네(119세)와 스페인 국적 여성 마리아 브라냐스 모레라(117세)를 거쳐 일본의 이토오카 도미코(116세)가 이어갔다. 2025년 현재 최고령자는 브라질의 이나 카나바호 루카스 수녀로, 116세를 넘겨 오는 6월 8일 117세 생일을 맞게 된다. 이들은 긍정과 평온을 장수비결로 꼽았다.
호모 헌드레드(Homo-hundred) 시대, 백세 상수(上壽)를 넘어 이제 120세를 이야기한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서는 120세를 상수라고 했는데, 공자의 선견지명이 됐다. 조선시대 왕의 평균 수명은 46.1세, 백성들은 훨씬 짧은 30대 중반이었다. 유럽도 19세기 중반까지 50세를 넘기지 못했다. 2023년 한국인 기대수명은 여성이 86.4세, 남성이 80.6세까지 늘었다. 무병장수를 꿈꿔온 인류는 이제 100세 돌파도 시간문제다.
통계청 인구현황을 보면, 한국의 100세 이상 인구는 2024년 말 기준 8천577명이다. 여성이 7천52명으로 남성 1천525명보다 4.6배 많다. 경기도 1천947명, 인천시 506명, 서울 1천484명이다. 경기도에서 100세 이상이 100명 넘는 도시는 고양시(166명), 용인시(153명), 수원시(149명), 성남시(130명), 남양주시(120명), 부천시(107명), 안산시(106명) 등 7곳이다. 인천은 남동구, 부평구, 서구에 각 80명씩 47%가 집중되어 있다. 강화군 24명, 옹진군은 15명이다.
도심과 도농복합지역간 인구 대비 100세 이상 비율은 무의미하다. 물 맑고 산세 좋은 전원에 살아야 오래산다는 통념도 깨진지 오래다. 되레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장수의 요건 중 하나로 꼽힌다. 나이 들수록 병원 가까이 살라는 말이 나온 까닭이다. 생로병사(生老病死)에서 ‘病’의 시간이 길어지면 장수는 되레 악몽이 된다. 100세 이상 인구가 많은 장수도시가 곧 건강도시는 아니다. 고령층의 생활환경을 살피고 의료복지 체계를 견고하게 만드는 정책이 중요하다. 그래야 장수가 축복이 된다.
/강희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