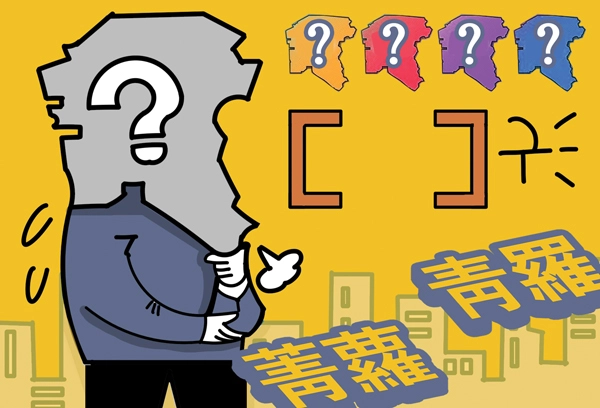
사람들은 무언가에 이름을 붙일 때 그에 걸맞은 뜻을 담아내려 애쓴다. 아주 오래 전부터 그래 왔다. 우리 옛 선비들은 명(名), 자(字), 호(號), 이렇게 세 가지나 되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 추사 김정희의 경우 호가 300개가 넘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름 짓기는 의미 부여의 과정이다. 인천광역시 서구가 검단구와 분리되면서 새로운 구(區) 명칭을 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진통이 여간 큰 게 아닌 모양이다.
서구의 개명 과정이 시끄러운 이유는 ‘청라’에 있다. 구민 여론조사에서는 ‘청라구’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정작 청라지역 일부에서는 ‘청라’라는 이름을 구 명칭으로 쓰는 데 반대하고 나섰다. 어떤 이는 ‘청라’라는 지명을 구 전체 이름으로 삼는 일이 ‘청라’의 정체성을 빼앗는 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청라’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 이를 살피기 위해서는 ‘청라’를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청라(靑羅)’는 원래 이름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현재의 명칭은 매립되어 사라진 청라도에서 유래했다. 한자로는 ‘菁蘿島’라고 썼다. 그런데 별안간 ‘청라(靑羅)’로 바뀌고 말았다. 그야말로 정체성 상실이다.
문제의 발단은 2004년 발간된 ‘서구사’에 있다. 이 ‘서구사’를 보면, 앞뒤 겉표지 안쪽에 실은 옛 지도에는 ‘菁蘿(청라)’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 내용에는 ‘靑羅(청라)’라고 표기했다. 2014년에 나온 ‘서구사’의 내용 역시 마찬가지다. 지명 연구에 매진한 서구 출신 향토사학자 이훈익(1916~2002) 선생 등은 ‘菁蘿(청라)’라고 썼고, ‘섬의 모양이 푸른 댕댕이덩굴 같이 여러 갈래로 뻗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 유래도 설명했다. 그런데 이게 ‘서구사’를 출간하면서 갑자기 ‘靑羅(청라)’로 슬그머니 바뀌었고, 유래도 ‘푸른 덩굴 관목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라고 엉뚱하게 풀이했다. 댕댕이덩굴(蘿)이 비단(羅)으로 둔갑한 순간이기도 하다.
청라가 ‘菁蘿’이냐 ‘靑羅’이냐는 문제는 무척 중요하다. 그 지명의 정체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사람으로 치면 정(丁)씨냐 정(鄭)씨냐를 따지는 문제와 같다. 서구는 곧 새로운 구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 서구는 개명 작업을 하는 김에 잃어버린 청라의 원래 이름과 그 뜻까지 찾아주길 기대한다.
/정진오












